

야권의 비극은 지지기반이 단일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시작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층은 대체로 보수성향층이라는 단일한 특성을 지녔다. 하지만 야권 성향층에는 진보층, 중도층, 호남층이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지지자 그룹들이 모여 있다. 이 세 그룹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 새누리당과 경쟁구도를 이룰 수 있었다. 반보수, 반새누리 정서를 기반으로 한 심판론과 견제론을 통해 세 개 그룹이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 왔다.
하지만 ‘진보와 중도 그리고 호남의 삼자연합’이 이번 총선에서는 해체되어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정비되고 통합’되어 있어야 겨우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는데 흐트러져 있으니 경쟁구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워졌다.
지금 같은 구도라면 새누리당은 현 의석을 뛰어넘는 180석 획득도 가능하다.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영남 의석수, 60세 이상 고령 유권자들 증가 및 적극적 투표참여, 그리고 야당 분열로 인한 수도권에서의 어부지리는 새누리당에 압승의 성적을 안겨줄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과 비교할 만한 이전 선거를 굳이 찾자면 선거 종류는 다르나 비슷하게 나뉘어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당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수는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다. 경기도에서도 31곳 중 27곳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열이 낳은 결과였다. 물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평가받는 여당이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 특성을 무시하긴 어렵다. 5%포인트 내 칼날 승부처가 도처에 널린 수도권에서 야권의 분열은 가물에 콩 나듯 당선자를 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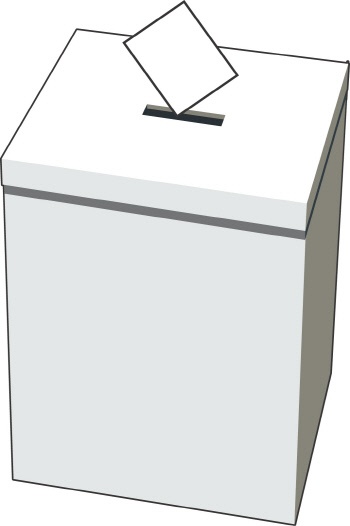
이질적인 3개의 그룹을 묶어주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게 된 점도 야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로 국민들이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쓰는 것인데 평가 도구인 야당이라는 회초리가 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또 정권에 대한 평가보다 야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당이라는 선택지가 많아져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야권이 기대감을 만들지 못하면 투표율이 제약될 수도 있다. 정보 습득과 이해가 빠른 젊은 야권층은 해당 지역에서 야당 분열로 지지후보의 당선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 인지하게 될 경우 사표심리로 인해 투표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긴다고 예단하긴 이르다. 비록 야권의 다른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인 선거연대를 적극 추진하진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개별 지역 내에서 후보 간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야권 의석은 300석에서 새누리당 의석을 뺀 수치이니 현 의석수보다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호남에서만큼은 더민주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제법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쪽이 경쟁할 경우 국민의당 후보들의 선전이 호남에 비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중도층이 주된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도층의 총선 투표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70% 이상의 투표율인 대선에서는 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만 50% 초중반의 투표율을 보이는 총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의당은 어떨까. 제1야당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구 의석 확보와 비례득표율 확대가 기본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이 전략이 적용되기 어렵다.
더민주와의 선거연대가 국민의당 출현으로 인해 수월해진 측면도 있지만 비례득표는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등이 얻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 투표는 제1야당에, 비례투표는 군소진보정당에 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야권 정당이 더 늘어난 점, 그리고 제1야당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정의당에 갈 수 있는 비례투표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홈
정치
홈
정치
